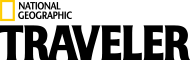브리스킷과 번트엔즈, 그리고 무엇이든지 허용하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미국 중서부 캔자스시티의 바비큐 문화를 정의한다. 이곳 사람들은 훈제하고, 그을리고, 불에 직접 구워낸 모든 것들에 끝없는 식욕을 보인다.

불과 10분 전만 해도 몇몇 사람만 드문드문 서 있던 셰프 J 바비큐Chef J BBQ 앞에 어느새 긴 줄이 늘어섰다. 11월의 캔자스시티kansas city 웨스트 바텀스West Bottoms 지역은 정오에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상쾌해진다. 이 미국 중서부의 하늘은 돔으로 둘러싸인 듯이 비현실적으로 푸른빛을 낸다. 식당 간판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그저 벽에 기대놓은 낡은 나무 팔레트에 희미한 흰 글씨로 비프 브리스킷, 칠면조, 돼지갈비, 번트엔즈burnt ends 같은 메뉴가 적혀 있을 뿐이다.
문이 열리자 삐걱대는 나무 계단을 올라 오래된 적벽돌 타운하우스로 들어선다. 주름진 철판으로 둘러싸인 카운터 위 커다란 칠판에는 다양한 부위의 고기부터 샌드위치, 사이드 메뉴가 큼직하게 적혀 있다. 뒤쪽 주방에서는 연기와 함께 고기 냄새가 강렬하게 흘러나온다.
“저는 좀 거칠고 투박한 스타일이에요.” 2020년에 이 식당을 연 오너이자 바비큐 장인인 저스틴 ‘J’ 이스터우드Justin ‘J’ Easterwood가 자랑스레 레스토랑을 둘러보며 말한다. “반짝이는 새것에는 큰 관심이 없죠.” 칙칙한 녹색 스웨터 차림에 갈색 머리를 뒤로 묶고 오른팔을 따라 붉은 문신이 춤추듯 번져 있는 저스틴은 10대 때부터 불에 매료돼 살아왔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식당 밖에서 거대한 잠수함처럼 보이는 훈연기를 밤새 태우며 다음 날 사용할 많은 양의 브리스킷을 조리한다. 그것이 다 팔리고 나면 그의 하루가 끝난다.
“불로 요리하는 것은 조금 특별해요.” 저스틴은 타닥거리는 숯불 위에서 갓 구운 기름진 브리스킷, 달콤한 소스를 바른 갈비, 부드럽게 구워낸 돼지고기 번트엔즈를 내어오며 말한다. “단순히 버너를 켜거나 온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죠. 불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살아 숨 쉬는 존재 같죠.”
번트엔즈는 보통 소고기로 만들지만 그는 돼지고기를 선호한다. 오랜 시간 훈연해 만드는 브리스킷을 한 입 베어 물면 처음엔 단단하지만 이내 녹아내리며 짭짤하고 기름진 풍미가 버터처럼 입안 가득 퍼진다. 그는 캔자스시티 바비큐의 특징으로 꼽히는 당밀이 들어가 진하고 끈적이는 소스 대신, 고기 본연의 풍미를 최대한 살리는 방식을 선호한다. 어쩌면 이 도시도 그처럼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기질을 지녔는지도 모른다.

미국 중서부 한가운데, 미주리주와 캔자스주 경계에 걸쳐 있는 이 도시를 현지인들은 ‘KC’라고 줄여 부른다. 19세기엔 미주리강 교역의 거점이자 교차로로 번성했으며, 금주령이 시행된 1920년에는 마피아 보스 톰 펜더개스트Tom Pendergast의 영향 아래 무법 도시로 악명을 떨쳤다. 도시의 스피크이지 바는 법을 피해 술을 마시려는 연예인과 정치인, 음악가들로 북적였다.
그들의 본거지는 당시 흑인 공동체가 모여 살던 18번가와 바인Vine 거리 일대의 담배 연기 자욱한 재즈클럽과 술집들이었다. 바로 이곳에서 헨리 페리Henry Perry가 낡은 전차 차고 옆 노상에서 바비큐를 팔기 시작했다. 고기를 잘게 썰어 신문지에 싸서 내놓는 그의 독특한 요리법은 큰 인기를 끌었고, 결국 1949년 그 자리에 상징적인 식당인 아서 브라이언트 바비큐Arthur Bryant’s Barbecue가 문을 열었다. 이후 잭 니콜슨과 버락 오바마 같은 유명 인사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식당을 열고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캔자스시티에는 100곳이 넘는 바비큐 식당이 있으며, 헨리 페리는 ‘캔자스시티 바비큐의 아버지’라고 칭송받는다.

텍사스가 소스나 마리네이드를 최소화한 소고기 브리스킷을 훈제하고, 캐롤라이나에서는 식초나 머스터드 소스로 돼지고기에 맛을 더한다면, 캔자스시티는 특유의 자유분방한 기질로 바비큐를 관대하게 정의하고 발전시켰다. 이 도시에서는 모든 것이 테이블에 오르고, 누구나 그 자리에 초대된다. 처음 온 이들도 예외가 아니다.
2014년 미드타운에 문을 연 Q39는 노출된 벽돌 벽에 세피아 톤의 옛 사진, 기사 스크랩, 판매용 소스 병, 그리고 가게 창립자이자 바비큐의 전설인 롭 매기Rob Magee의 트로피들이 빼곡하다. 바 위쪽에는 TV가 줄지어 있지만 유심히 보는 손님은 거의 없다. 대신 음식과 대화에 집중한다.
“주방을 이끌기도 했고 호텔을 열어본 적도 있지만 바비큐 레스토랑은 처음이었어요.” 수석 셰프 필립 톰슨이 바 근처 테이블에 앉아 Q39에 오기까지의 여정을 들려준다. 전형적인 미국 바비큐를 앞에 두고 영국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묘한 경험이다. 2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아온 그는 미국 중서부 억양이 묻어나는 말투로 어쩌다 바비큐에 빠져들었는지 설명한다. 필립은 눈을 크게 뜨고 손짓을 섞어가며 말하는데 그 표정과 제스처에는 바비큐를 향한 경외심이 담겨 있다.
“번트엔즈야말로 캔자스시티 바비큐의 진수죠.” 그는 Q39의 미로 같은 주방을 안내하다가 브리스킷의 바삭한 끝을 잘라내며 말한다. 이곳의 거대한 훈연기는 히코리 나무를 넣고 한 번에 최대 16시간 동안 고기를 훈제한다. 나는 사각형 고기 조각을 천천히 씹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맛을 음미한다. 새까맣게 탄 겉면과 촉촉한 분홍빛 속살의 대비는 그야말로 황홀하다. 필립이 장난스레 ‘고기 마시멜로’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다. 놀랍게도 바비큐 초창기 시절에 번트엔즈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동안 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정도로 홀대를 받았다.
“그땐 ‘번트 에지(탄 가장자리)’라고 불렀습니다.” 필립이 설명한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셰프들이 브리스킷 끝부분에 지방이 아주 고르게 배어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 후로 이 부위를 따로 잘라내 큐브 모양으로 내놓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의 번트엔즈입니다.” 테이블로 돌아오자 부드러운 삼겹살, 두툼하고 육즙 가득한 브리스킷, 치폴레 바비큐 소스를 입혀 노릇노릇 구워낸 치킨 윙이 차려져 있다. 바비큐의 가장 원초적이고 직관적인 형태에 압도되는 기분이다. 하지만 이 마을에선 게이츠 BBQ나 아서 브라이언트 같은 전통 있는 바비큐 식당들에서 이런 최고급 부위 바비큐를 풍성한 소스와 함께 샌드위치로 만들어 먹는 변형된 방식 또한 사랑받는다.
캔자스시티의 맛

타운 토픽 햄버거
1937년부터 시작된 이 소박한 버거 가게는 붉은 네온사인이 돋보이는 미국풍 가게다. 24시간 내내 그릴 위에서 패티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소고기와 양파 향이 식당의 부엌 조리대를 가로질러 풍겨 나온다. 늦은 밤, 맥주 한두 잔을 즐긴 뒤 들러 더블치즈버거와 감자튀김을 주문하면 진짜 미국식 밤을 경험할 수 있다. 버거는 약 7000원부터.
towntopic.com
바인 스트리트 브루잉
미주리주 최초의 흑인 소유 양조장으로, 18번가와 바인 거리 일대의 전통 외식 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매주 화요일에는 시트러스 향의 아메리칸 페일 에일 마리스Maris부터 바닐라 풍미의 베이스 레이디Bass Lady 스타우트까지 다양한 맥주 시음이 가능하다. 뮤지션 케멧 콜먼Kemet Coleman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이 양조장에서는 정기적인 라이브 재즈 공연도 열린다. 14온스 생맥주 한 잔에 약 1만원부터.
vinestbrewing.com
세븐 스완 크레페리
언덕 꼭대기에 위치한 이곳에서 다운타운의 멋진 전망을 감상해보자. 짭짤한 크레페, 달콤한 크레페, 비건 크레페 등 메뉴가 다양하다. 처음 방문하면 ‘KC 클래식’을 추천한다. 허니 햄, 얄스버그 치즈Jarlsberg cheese, 루콜라에 통곡물 머스터드를 듬뿍 넣은 크레페다. 주말에는 붐비므로 기다림을 감수해야 한다. 크레페는 약 1만6000원부터.
sevenswanscreperie.com
폭스 앤 펄
웨스트사이드에 위치한 아늑한 레스토랑으로, 셰프 본 굿Vaughn Good이 선보이는 정통 중서부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현지의 제철 식재료를 사용해 메뉴가 계절마다 바뀌며, 겨울에는 무쇠 프라이팬에 담아 살짝 구운 페이스트리와 함께 나오는 진한 토끼고기 파이를 추천한다. 목요일 저녁에는 훈제 돼지고기 샌드위치와 소 볼살 케사디야를 포함한 바비큐 세션이 열린다. 두 가지 코스 요리가 약 4만원부터.
foxandpearlkc.com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교외에는 캔자스시티에서 가장 독특한 바비큐 샌드위치를 파는 식당이 자리한다. 주차장에 들어설 때 미국 중서부 특유의 밝은 햇살에 눈이 부셔서 실눈을 뜨자 담청색 캔자스 번호판 사이로 몇몇 캘리포니아와 루이지애나 번호판이 눈에 들어온다. 캘리포니아 중부에서 이곳까지는 무려 2700km. 조스 캔자스시티 바비큐Joe’s Kansas City BBQ의 주차장은 그만큼 열정적인 바비큐 순례자들이 모이는 장소다. 주유소 겸 식당인 이 민트색 건물은 2005년 셰프이자 유명 TV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앤서니 부르댕Anthony Bourdain이 방송에서 소개하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분이 우리의 사업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 가게가 지나가다 들르는 곳이 아닌 목적지가 되게 했죠.” 조스의 마케팅 이사 에릭 타다Eric Tadda가 말한다. 우리가 창가 자리에 앉아 고속도로를 따라 큰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거대한 차들을 지켜보는 동안, 천장에 매달린 스피커에서는 쓸쓸한 분위기의 컨트리 음악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앤서니 부르댕이 인정한 주유소를 겸한 이 식당은 자체만으로 독특한 매력을 자아내지만, 다른 주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다. 지맨Z-Man 샌드위치도 빼놓을 수 없다. 나는 에릭에게 이 전설적인 샌드위치를 먹지 않고서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고 말한다. 지역 라디오 DJ 마이크 제렉Mike Zerek(‘더 지맨theZMan’)의 이름을 딴 샌드위치인데, 그는 이 가게를 줄기차게 방문해 녹인 치즈와 양파튀김 두 개를 얹은 브리스킷 샌드위치를 주문했다고 한다.
“그는 그냥 계속 그걸 주문했어요.” 에릭이 설명한다. “이후 직원들끼리 샌드위치 이름 공모전을 진행했는데, ‘지맨’이라는 이름 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히트 상품이 됐죠.”
지맨은 예상보다 크기가 작았지만 한 입을 먹는 순간 하루에 200개 이상 팔리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양파튀김은 샌드위치용으로 얇게 썬 훈제 브리스킷과 완벽하게 어우러지고, 버터를 발라 구운 카이저 롤kaiser roll 빵 속 녹아내린 치즈가 식감을 한층 부드럽게 만든다. 캔자스시티에서 먹어본 음식 중 단연 최고일 뿐만 아니라, 바비큐 문화를 경험하고 싶은 이들에게 최고의 입문용 샌드위치이기도 하다.
무엇이든 허용되고 여유롭고 자유분방한 도시 캔자스시티에는 단 한 가지 규칙만 존재한다.
끝없는 식욕을 준비해 올 것.

*** 더 많은 기사는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 10월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