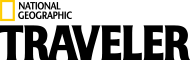“걷기는 이동하면서 하는 은둔이다.
걷는 동안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
걷기를 통한 사유는 복잡한
일상으로부터의 비움이기도 하다.”

호모비아토르
Homo Viator
동물은 다 걸을 수 있다. 걸으면서 몸을 앞으로 이동시키지 않는다면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인간은 호모비아토르다. 인간의 속성이 나그네처럼 끊임없이 옮겨 다닌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특별한 목적 없이도 걸을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의 특징이기도 하다.
문명은 구경거리spectacle를 만들고 이미지 생산자들을 후원한다. 문명의 세례를 받은 이미지 수집가들은 그럴싸한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를 즐긴다. 그들은 걷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풍경을 수집하고, 풍경에 포획되었기 때문이다. 구경이 끝나면 또 다른 구경거리를 찾아 떠난다. 이것은 걷기가 아니다.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등산이 레저 활동의 주종이었다. 대부분의 스포츠처럼 등산 역시 정점이라는 목표를 지향한다. 정상에 이를 때까지 앞을 향해 부지런히 나아간다. 정상까지 가지 못하면 등산을 했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등산은 초보자에게는 버거울 뿐만 아니라 정상에 빨리 도달하겠다는 목표와 성과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반면, 걷기는 정점이 없으며 속도의 강박도 없다. 초보자나 경력자나 별다른 우열도 있을 수 없다.
걷기가 유행하면서 올레길, 둘레길, 새재길, 해파랑길, 자락길 등 브랜드화된 길이 속속 등장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길’이 만들어지고 있을 터이다. 길이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왜들 갑자기 길 마케팅에 분주해진 걸까? 걷기에 대한 욕구는 산업문명의 속도와 그에 따른 소외에 대한 항거일 듯하다. 걷기는 걷는 속도에 따라 다가오는 풍경처럼 느릿한 상념의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정상에 오르기보다는 둘레나 언저리를 탐색한다.
걷기에도 몇몇 유형이 있다. 절대자의 은총을 찬양하거나 영성을 고양하기 위한 순례, 개선장군 같은 보무당당한 행진 등이 있다. 보통 순례나 행진을 할 기회는 거의 없다. 문화적인 행위로서의 걷기가 소요다. 걷기 자체를 누리려는, 굳이 목적이라면 주변 풍경과 교감하거나 내부로 침잠하는 사유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걷기는 삶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다.
장자처럼 노닐기
고대 중국 사상가 장자는 ‘인생을 바쁘게 살지 말라’고 했다. 삶을 그대로 누리며 살아야지, 하루하루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소풍처럼 여기라 했다. 삶이라는 여행은 특별한 목적지가 없으며 그 자체로 목적이 된다. 그렇게 여행 자체를 즐기라는 것이 장자의 ‘소요유’다.
소(逍)는 ‘노닐다’는 뜻이고, 요(遙)는 ‘멀리 가다’라는 뜻이며, 유(遊)는 ‘떠돌다’는 뜻이다. 逍遙遊 이 세 글자 모두 ‘착(辶)’을 깔고 있는데, 辶은 ‘착(辵, 쉬엄쉬엄 가다)’에서 온 글자다. ‘소요유’는 세 번을 쉬라는 얘기다. 쉬면서 놀고, 쉬면서 가고, 쉬면서 돌아다니는 것이다. 장자도 무엇인가를 도모했겠지만 쉬엄쉬엄 했던 모양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학생들과 길을 걸으며 얘기하는 방식으로 진리를 탐구했다. ‘페리파토스학파peripatetic school(소요학파)’다. 왜 걸어 다니며 토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걸으면 두뇌 활동이 촉진돼 의식이 맑아진다는 것이 현대 과학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후 그리스 철학의 계보를 이은 독일의 철학자들도 걷기를 즐겼다하. 이델베르크에는 ‘철학자의 길Philosophenweg’이 있다. 칸트도 이 길을 걸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의 하루 일과에는 걷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에게는 걷기가 의무이자 도덕이었으며, 사유와 진리 탐구의 기반이었다. 서양 근대 철학을 빛낸 그의 다른 이름은 ‘생각하는 칸트, 걷는 칸트’다.
일본 교토에도 철학의 길(哲学の道)이 있다. 긴카쿠지(銀閣寺)부터 난젠지(南禅寺)까지 이어지는 천변의 둑길로 교토대학의 철학 교수가 걸어 다니면서 사색을 즐겼다고 한다. 계절 따라 벚꽃이나 단풍이 절경인 길을 무심히 걸었던 기억이 아련하다. 돌 틈으로 졸졸 흐르는 물소리, 물속으로 폴짝 뛰어드는 개구리, 신발 바닥에 밟히는 흙 알갱이 소리가 침묵의 밀도를 높여준다. 소리에 집중할수록 풍경에는 둔감해진다. 시각이 아닌 청각으로 맛보는 고요다.
걷기는 특정한 거처를 점유하지 않는다. 내딛는 걸음걸음이 나그네다. 걷기는 고독하고 자유롭다. 예기치 않은 맞닥뜨림이라는 경이로움과 바람처럼 들고나는 상념으로 충만하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했는데, 나는 걷는다, 고로 존재한다.

소요헌
逍遙軒
경북 군위에는 걷기 위해 조성된, 정확히는 생각하기 위해 만들어진 숲이 있다. 사유원(思惟園, 두루 생각하는 정원)이다. 사전 예약이 필수며 대중교통으로는 접근하기 힘들다. 정문에서 물과 노란 우산, GPS카드를 나누어준다. 위치 추적 카드를 목에 걸고 방문객은 숲길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10여만 평이 넘는 숲속에 드문드문 설치된 구조물들은 ‘작품’으로서의 건물이다. 이곳의 건물들은 ‘사유’라는 콘셉트로 기획된 작품, 대형 오브젝트다.
입구의 계단을 지나 오솔길을 걷다 보면 제일 먼저 소대(巢臺, 새둥지 전망대)와 소요헌(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집)을 만난다. 포르투갈의 건축가인 알바로 시자Alvaro Siza의 작품이다. 소대는 전망대이지만 살짝 삐딱하게 만들어져 대형 조각 작품처럼 보인다. 내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기울어진 벽면과 뻥 뚫린 창이 비현실적인 환영으로 다가온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주변의 산세 또한 몽상적이다. 새들의 시각이 이럴까?
소요헌은 사유원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으로 장자의 ‘소요유’에서 따온 것이다. 본래 스페인 마드리드에 피카소 뮤지엄으로 계획되었다가 보류되면서 이곳에 설치되었다. 소요헌에서는 자연과 문명의 격렬한 호응을 맛볼 수 있다. 빛과 건물, 신록과 콘크리트가 교호하면서 아기자기한 디테일을 만들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신전처럼 엄숙하다.
이곳에 있는 작은 정원의 이름이 소요유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은 아니며 눈으로만 음미할 수 있다. 언뜻 일본의 전통 정원인 ‘마른 산수[枯山水, かれさんすい]’가 떠오른다. 가레산스이는 무로마치 시대의 선종 사찰에서 많이 이용했던 양식으로 물이 없이 돌이나 모래 등으로 산수의 풍경을 연출한다. 담담하고 고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교토에 있는 료안지(龍安寺)와 긴카쿠지의 정원이다. 알고 보니 사유원의 조경 작업에 일본인 조경가가 참여했다고 한다.
관광지나 유적지, 공원에는 안내판이 필요하지만 난삽하고 과잉된 정보는 시지각적 혼란을 일으킨다. 지역의 역사나 인물에 대한 소개, 유적에 대한 경직된 설명, 건물의 건축 공법, 일관성 없는 각종 표식, 여기에 온갖 경고문과 약삭빠른 광고문은 더욱 피곤하다. 경치나 풍경마저 도로처럼 포장하고 표지판을 붙인다. 이정표가 많으면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설렘이 줄어든다. 사유원은 화장실이나 음수대, 조명, 벤치, 이정표 등의 연출에 과함이 없다. 건축, 조경, 조명, 석공, 서예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예술적 성취를 위해 노력했다.
사유원의 설립자가 수집한 모과나무와 배롱나무로 만든 정원도 있다. 공을 많이 들였다. 예쁘기까지 하니 그림엽서 몇 장쯤 나올 수 있다. 건물이나 시설물에는 붓글씨로 쓴 이름표가 붙어 있다. 소백세심대(小百洗心臺, 소백산을 바라보며 마음을 씻는 곳), 풍설기천년(風雪幾千年, 천년의 모과정원), 별유동천(別有洞天, 배롱나무 꽃이 핀 별천지), 사야정(史野亭, 세련됨과 거침을 지닌 정자), 조사(鳥寺, 새의 수도원), 오당(悟塘, 깨달음의 연못) 등.
주변에 마땅한 식당가가 없으므로 점심식사는 사유원 안에서 해야 된다. 입장료와 식대를 합쳐 10만원이 넘는다. 만만찮은 가격답게 메뉴도, 인테리어도, 창밖의 전망도 나쁘지 않다. 건축가가 디자인한 식탁과 의자에 앉아 식사한다. 연못을 끼고 있는 이 식당, 사담(思潭, 생각하는 연못)에서도 명칭처럼 생각에 잠겨야 한다. 한자는 은유와 상징이라는 시적 표현에 유용하다. 그러나 번번이 한자의 뜻을 풀어 마음에 새기려니 부담스럽고 의미도 과해 보인다. 사유조차 지적으로, 강제되는 듯한 피로감이 든다.

명정
瞑庭
사유원 안쪽 깊은 곳에 이 숲을 기획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건축가 승효상의 명정(눈 감고 사유하는 뜰)이 있다. 초입에 있는 소요헌과 대구를 이루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다. 둘 다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사변적인 명칭에서도 그렇다. 입구에서부터 쉬엄쉬엄 걷기 시작해 숲 전체를 섭렵한 후 클라이맥스라고 할 만한 지점에서 눈을 감은 채 명상에 잠기는 곳이다.
내부로 향한 좁은 통로를 들어서면 맑은 물소리가 들려온다. 한쪽 벽면을 융단처럼 덮으며 흘러내리는 물이 커다란 사각형 수반 위로 떨어진다. 수면을 투과한 햇살에조 약돌이 반짝인다. 물이 흘러내리는 벽을 지나 뒤쪽으로 들어서면 묵직한 침묵의 공간이 이어진다. 기도실 같은 작은 방들이 붙어 있다. 삶과 죽음, 영생을 생각하는 공간이다. 영생이란 찰나를 의식하는 것이다. 마음의 전망대!
모든 곳을 둘러본 뒤 벽 사이로 난 가파른 계단을 따라 올라오면 눈앞에 사유원과 팔공산의 실루엣이 펼쳐지며 현실로 돌아온다. 여전히 사유원은 한적하고 고요하다. 이곳을 걸으면서 생각에 잠기고 마침내 비움을 소망한다. 침묵이 언어의 비움이라면, 여백은 공간의 비움이다. 사유는? 의식의 비움이다.
주변 진입로의 홍보물에 ‘빈자의 미학으로 유명한 건축가…’라는 문구가 보이는데, 이곳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사유원은 꼼꼼하고 사치스럽게 조성된 ‘사유의 왕국’이다. 걷기는 자신의 몸으로 사는 것, 자신의 생각 안에 존재하는 방법이다. 몸을 바로 세우고 정신을 맑게 가다듬어야 온전한 사유도 가능하다.
※ 박현택은 홍익대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했으며, 현재 연필뮤지엄 관장이다. 쓴 책으로 <오래된 디자인>, <보이지 않는 디자인> 등이 있다.